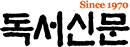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 어떤 책은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 속 명문장’ 코너는 그러한 문장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

[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결국 무사히 집을 빠져나와 문을 닫았다. 딸아이는 문 뒤에서 큰 소리로 울며 한바탕 흐느꼈다. 나는 두 가지 복잡한 감정에 이끌렸다.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찾아올 자유로 인한 기쁨. 솔직히 말해서 죄책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딸아이가 몇 번 울다가 울음을 멈췄으니까. 나는 그제야 발걸음을 내디디며 짧디짧은 자유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강의는 예전에 여행이 내게 선사해 주었던 것을 준다. 정확히 말하면 나 홀로 하는 이 짧은 외출은 나를 엄마와 아내에서 다시 한 여성으로 되돌려 놓는다. 에코백에는 기저귀도 물티슈도 아이 물병도 젖병과 분유, 아기 과자도 없이 오직 ‘책’(이 위에 중요 표시 해 주시길)과 필통, 그리고 내 텀블러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걸음에 힘이 붙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며, 얼굴이 어떻게 또 엄마에서 여성으로 되돌아왔는지 살펴본다.<146~147쪽>
따스한 이불 속에서 아이 얼굴에 내 얼굴을 가까이 마주 대니 아이가 웃었다. 가늘게 뜬 실눈, 찡그린 작은 코, 옹골찬 이마, 앙증맞은 입술이 천사처럼, 신의 은총처럼 특별했다.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낮에 나를 걱정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했던, 비명을 내지르게 했던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아이의 얼굴 속에서 가만히 멈춰 섰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101가지 일들도 딸아이의 자그마한 주먹 속에서 부서져 먼지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이 티 없는 여자아이에게서 떼어 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수정해야 할 글과 보내야 할 원고, 회신해 줘야 할 이메일, 첨삭해 줘야 할 학생들 과제, 설거지해야 할 그릇과 접시와 젖병, 이런저런 것들을 밀쳐놓고, 나는 이토록 기꺼이 아이를 안고 잠든다. 내일 아침, 또다시 시시포스가 거대한 돌을 밀어 올리듯, 엄마의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입을 맞추었다.<150~151쪽>
아이가 잠들면, 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책상으로 돌아갔다. 이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은 번잡한 생각의 갈피를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내가 주체로 개선(凱旋)하는 시간이었으며, 나 자신에게 충실한, 거울을 손에 쥐고 나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헤어나기 힘든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을 뒤로 하고, 달콤한 단잠을 단호하게 마다하고, 책상 앞으로 돌아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자판을 두드렸다. 과한 흥분에 사로잡혀 손가락을 덜덜 떨었던 적도 몇 번인가 있었다.<170쪽>
내가 글쓰기를 갈망하는 것이 이상할 리 없다. 특히나 선생님과 엄마라는 정체성이 나를 잠식할 때, 나의 존재감을 무장 해제시킬 때, 나는 써야만 한다. 곤혹스럽기 때문에, 피로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일들과 열렬하게 내게 달라붙는 아이들로 인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184쪽>
『아이가 눈을 뜨기 전에』
리신룬 지음 | 우디 옮김 | 원더박스 펴냄 | 328쪽 | 15,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