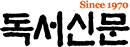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이중섭이 죽고 며칠 동안 그의 시신은 방치됐다. 돌보는 이 없고 찾는 이도 없는 무연고자였기 때문이다. 3일 뒤 친구인 시인 구상이 찾아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한 다음 뼈의 절반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가족에게 보냈다. 가족에게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처절하게 그림을 그려왔던 이중섭은 한 줌 재가 돼서야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삶을 갈아 붓으로 찍어 옮긴 소, 닭, 꽃, 아이들은 오늘도 쾌적하고 널찍하고 품격 넘치는 공간에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황금의 광채를 발하고 있건만. <18쪽>
동베를린 사건 이후 조국의 거부로 살아생전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했던 현대 음악의 세계적인 거장 윤이상은 2018년 3월, 세상을 떠난 지 23년이 지나서야 고향 통영으로 돌아온다. 거장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알리는 너럭바위에는 ‘처염상정(處染常淨)’ 네 글자가 새겨진다. ‘연꽃같이 맑고 깨끗하여라’라는 고인에 대한 후인들의 기억이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삶을, 그의 인품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의 음악을 ‘연꽃 같은 맑고 깨끗함’으로 기억한다는 뜻이다. <30~31쪽>
서울 성북동에 있는 절 길상사는 원래 ‘대원각’이라는 이름의 고급 요정이었다. 요정 주인인 김영한 씨가 10년 동안이나 법정 스님에게 절로 시주하겠다고 끈질기게 요청해 1995년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대법사’라는 절이 됐다. 그리고 2년 뒤인 1997년 시주자 김영한 씨의 법명 ‘길상화’를 따서 ‘길상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길상사는 7,000여 평의 넓이로 기부 당시 시가가 1,000억원대였다. 당시 한 기자가 김영한 씨에게 그렇게 큰 재산을 기부하는데 아깝지 않느냐 물었다. 이때 김영한 씨가 한 말이 “그까짓 1,000억,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였다. 백석, 김영한 그리고 백석의 시. 더해, 백석의 나타샤. <33쪽>
영랑은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 했다. 사실 봄은 영랑에게만 ‘찬란한 슬픔의 봄’이지 않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피는가 싶던 목련이 검은 눈물 돼 뚝뚝 떨어질 때 화사함은 차라리 아픔이고, 하늘인지 꽃인지 온통 어지러이 난만하던 벚꽃이 시샘봄바람에 비꽃 돼 쏟아져 내릴 때 눈부심은 되레 허망함이다. <77~78쪽>
『울림: 산 자를 위로하는 죽은 자의 마지막 한마디』
신동기 지음 | M31(엠31) 펴냄│256쪽│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