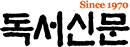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
그는 “마르크스가 상품을 가지고 벌인 일을 감정에, 적어도 낭만적 사랑의 감정에 적용해 보고자 했다”며 당찬 야심을 밝혔다. 소비자본주의로 기울어진 현대사회가 구성원들이 지닌 감정의 생산과 변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진단한 것이다. 즉, 사랑의 감정은 사회관계들로 형성된다. 감정은 현대 제도를 압축해낸 것임을 보여주려는 동시에 열망이다.
책은 다양한 책과 잡지 기사,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올라온 고백담과 댓글들, 그리고 연애와 불륜을 포함한 여러 부류의 ‘사랑’ 경험자들과 나눈 인터뷰를 토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현장’으로 파고든다. 그리고 그 안에 상실과 아픔과 눈물이 차고 넘치는 이유를 치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한다.
현대를 창출한 ‘계몽적 이성’과 ‘자유’는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감정’이 닿는 부분까지 ‘합리성’과 ‘자유로움’을 강제한다. 그래서 애인에게 버림받은 우리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성찰을 거쳐 나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나를 버린 상대방에 대해 윤리적 심판을 내리는 대신,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과 상대방의 사라짐을 직접 결부 짓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사랑의 상처’라는 경험이 아무리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지극이 ‘사회적인’ 경험이라고 역설한다.
‘심리학적’ 방식이 개인의 감정을 망가뜨리고 자존감을 죽이는 장치로 곧잘 활용됐다는 주장도 흥미롭다. 저자는 사랑이 왜 심리학적 치유의 대상으로 퇴화했는지, 특히 사랑은 왜 여성을 약자로 만들었는지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며 ‘이성애 혹은 이성관계의 밑바탕’을 폭로한다.
예컨대 그는 인간의 행동방식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리적 현상으로 다루는 설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어떤 사랑을 선호하는가 하는 태도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일찌감치 형성된다고 말하는 프로이트 문화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른바 프로이트 문화의 유행으로 인해 내 파트너는 나의 어린 시절 경험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사랑의 고통은 결국 개인이 자초한 것이라는 파괴적 결말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게 됐다는 통찰이다.
사회학은 사회의 틀이 만들어 낸 조건에 주목하는 학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의 틀이 빚어낸 문화 모델이 전략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딜레마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저자 역시 이런 틀을 만드는 현대적 사랑의 조건을 여러 각도로 탐구하고 있다.
책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려 하는 바는 “아픔 없는 열정적 사랑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소 서정적인 교훈인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간 ‘상처의 치유’에만 주력해 온 심리학이 놓친 중대한 결함이기도 하다.
■ 사랑은 왜 아픈가
에바 일루즈 지음 | 김희상 옮김 | 돌베개 펴냄 | 556쪽 | 30,000원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