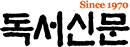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시인들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시민이라 여기면 얼마나 친근할까요. 신비스럽고 영웅 같은 존재였던 옛 시인들을 시민으로서 불러내 이들의 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국민시인’, ‘민족시인’ 같은 거창한 별칭을 떼고 시인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시도 불쑥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능하면 멀리 떠날 거야
무너진 집터 굴뚝에 앉아 있거나
장난삼아 짖는 개 한 마리를 물끄러미 볼 거야
바람이 해 질 녘을 알려줄 때면
휘파람 부는 법을 잊지 않도록 길게 불어 볼 거야
달빛에 달리자면 울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
길이 아닌 곳을 지날 때는 원망도 할 거야
그러나 의심하진 말아 줘
다만 투정일 뿐
내 혈통이 물었지
뜨겁게 살지 못해도 좋으냐고
매일 죽어가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대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지도를 향해
짐도 없이 떠날 거야
돌아오지는 못할 거야.
*Hasta la victoria siempre(“승리의 그날까지 영원하라!”)
―양선, 「영원하라*」
승리의 그날까지 영원하라!
우리는 되돌아보는(retrospective) 사람입니다. 단순히 과거 회귀적 존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론가 가던 길입니다. 그 도중에 오던 길을 다시 바라볼 뿐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와 미래로 가는 게 맞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은 무의미합니다. 곧 사라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시간이란 헤아리는 영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지 않았다면, 다가올 미래를 살 수 없다면 그 시간은 영혼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지요. 이 의미 없는 시간의 반복을 삶(生)이라 한다면 목숨(命)은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생명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고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로 존재하는 나밖에 없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따라야 합니다.
양선은 과거를 끌어와 미래의 일부를 사는 오늘의 시인입니다. 시 「영원하라」는 그의 첫 번째 시집 『꽃 진 자리 모로 눕다』에 실렸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의 영혼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체 게바라’입니다. 나날이 혁명처럼 사는 길은 무얼까요. 체 게바라가 의사의 안온한 삶을 버리고 혁명의 와중에 스스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는 부정(不正)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 제목 ‘영원하라’는 “Hasta la victoria siempre(“승리의 그날까지 영원하라!”)”에서 따온 겁니다. 체 게바라가 쿠바 공산당을 떠나 또 다른민중의 바다로 떠나며 한 말입니다.
지금은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더디 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숨이 위태롭고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감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인이 말하듯, 혁명가가 그러했듯 우리는 “매일 죽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지도’를 손에 쥐고 멀리 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다 역사의 흔적으로 남을 수 없기에 우리의 서사는 늘 지워지고 망각됩니다. 시는 그것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방을 꿈꾸는 것입니다.
■작가 소개 | 이민호 시인
1994년 문화일보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참빗 하나』, 『피의 고현학』, 『완연한 미연』, 『그 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