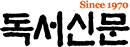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
출산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1.08명으로 43만 8천여 명이 태어나 지난 2000년 63만7천여 명에 비해 무려 20만 명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명은 물론 국가가 아닌 홍콩(0.95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그 충격의 여파는 상상을 불허한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에 정부 역시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이대로 갈 경우 경제ㆍ사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할 정도라고 염려하고 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하락만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양육환경,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실업과 고용 불안, 높은 주택구입 비용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꼽고 있다.
특히 양육. 교육비 부담은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 생활비의 절반 이상(59%)을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만하다.
이러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기회비용의 상실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늙어서 자식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이러한 의식은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즉, 자식에 대한 투자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무능력한 정책도 한몫했다. 자녀를 둔 일반 가정의 수입 절반이상이 자녀의 사교육비로 쓰여짐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다시피하면서 특별한 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있다. 기껏 자식을 더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정부의 지원금과 자녀의 양육, 교육비를 비교해 봤을 때 출산장려금은 그야 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출산율 저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그러한 출산장려금보다는 사교육비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가치관 역시 급속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정부는 따라가지 못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항상 뒷북만 치는 정부의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요소를 제거하는데 힘써야한다.
독서신문 1403호 [200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