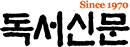햇살이 내리쬐는 사거리에 서있었다. 여름 저녁 특유의 쾌활함이 느껴져 발걸음이 가벼웠다. 20분이나 늦었음에도 길을 건너며 그렇게 느긋했다. 약속 장소에 앉은 이는 초면인데 낯이 익다. 그를 내게 소개시킨 이는 나의 사촌오빠. 그들은 오랜 동네 친구였는데, 그 동네는 삼촌댁이니만큼 내게도 익숙한 곳이었다. 게다가 그는 최근 우리 동네에 살았으며, 내 사무실 옆 건물이 그의 사무실이라고도 했다. 운명이나 뭐 그런 거대한 건 아닐거라 생각하면서도 신기했다. 그 때까지 그 사람을 숨겨왔던 세상이 마침내 그 날, 투명하게 제 속을 열어 보인 것이다.
그와 나는 부부가 되었다.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이른 봄이었다. 막 세상에 나온 아이는 어딘지 낯설고 놀랍게 먹먹했다. 나는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이 아이를 기다려온 느낌이었다. 어쩌면 생을 거스르는 기억. 처음보는 작은 얼굴에는 또렷한 친근함이 있었다.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이의 증조 할아버지와 꼭 닮았다며 놀라셨다.
아이가 자라며 그 철두철미한 성정은 양가의 할아버지들을, 야무진 손끝은 할머니들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14대 조부의 어진 성품과 명철을 닮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통이다.
잘 몰랐을 뿐, 분명히 우리에게도 새겨져 있을 무수한 이야기와 서먹한 기척을 아이에게서 본다.
"할아버지께서 콧수염이 있으셨던가?"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지는 물으셨다. 갑작스런 질문에 할아버지의 모습을 급히 더듬어보았다. 하얀 머리와 자그마한 체구. 콧수염은 없으셨는데. 골똘한 나 대신 친정 아빠가 대답을 하셨다.
"젊으실 적 잠시 콧수염을 기르셨습니다." 맞다. 아빠의 대학교 졸업 사진 속 할아버지는 콧수염을 기르고 중절모를 쓰신 신사의 모습이셨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어졌다.
"호가 월곡이시지요? 월곡동에 사셨고요."
"예"
"제가 70년대에 00동에서 000선생님께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 때 같이 배우던 분 중에 월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생각해보니 그 분이 연진이 할아버님 아닐까 싶어요." 아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맞습니다. 그 때 아버지께서 거기서 서예를 배우셨어요."
"그렇지요? 월곡이라는 호가 흔한 호가 아닌데다 연배가 맞을거라 생각했어요. 호탕한 분이셨어요.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동문들 밥도 잘 사주셨어요."
순간, 반가움을 누르고 튀어나온 것은 어리둥절함이었다. 늘 꼬장꼬장 엄격하시던 할아버지에게 저런 면이 있었다니. 내가 모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이것 참, 인연은 인연이네요."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가을 오후가 한층 명랑해졌다.

영화나 소설에 비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딘지 성글고 지극히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빅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시공간 어딘가에 작은 틈이라도 났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달라졌을 터. 아찔함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스쳐간 바람 한 점에도 고마움이 든다.
우리는 어디서부터였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 조물주의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다만 전생이든 현생이든, 나는 착한 삶을 살았던거라고. 그래서 우리 셋이 만났다고. 그렇게 믿고 싶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가 부르던 이 노래처럼.
[난 심술궂은 어린 시절과 힘든 사춘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랑하는 당신을 만났으니
과거 어디쯤엔가 난 착한 일을 한게 분명해요.]
이 작은 아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눈물과 웃음이 들어있는지 나는 영원히 모를 테다. 수많은 씨실과 날실이 오간 끝에 맺힌 곱디 고운 한 점. 아이야, 그렇게 태어난 네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 너는 아니. 나와 당신 역시 그러하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소한 신비이다.

■ 작가소개
스미레(이연진)
자연육아, 책육아 하는 엄마이자 미니멀리스트 주부.
아이의 육아법과 간결한 살림살이, 마음을 담아 밥을 짓고 글을 쓰는 엄마에세이로 SNS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