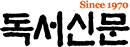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 독서신문은 소설집 등 책의 맨 뒤 또는 맨 앞에 실리는 ‘작가의 말’ 또는 ‘책머리에’를 정리해 싣는다. ‘작가의 말’이나 ‘책머리에’는 작가가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 또는 소회를 담고 있어 독자들에겐 작품을 이해하거나 작가 내면에 다가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독서신문은 ‘작가의 말’이나 ‘책머리에’를 본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췌 또는 정리해 싣는다. 해외 작가의 경우 ‘옮긴이의 말’로 갈음할 수도 있다. <편집자 주> |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 이날까지 ‘커다란 무기’에 꽂혀 지냈다. 평화를 사랑하는 오랜 퀘이커 집안의 후손으로서는 별일이 아닐 수 없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새나 얼룩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휘어진 엄니가 우람한 마스토돈, 아니면 1.5m나 되는 뿔이 달린 트리케라톱스였다.
성인이 되고 생물학을 전공한 뒤, 나는 ‘커다란’ 것이 절대적인 크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극한의 무기란 것은 단지 비율의 문제였다. 아주 작은 동물도 더러 더없이 웅장한 무기를 갖고 있다. 박물관 자료실 서랍에는 말려서 핀에 꽂아 차곡차곡 담아 놓은 기괴한 동물 종들의 표본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예를 들어 앞다리가 너무 길어서, 상자 두껑을 덮기 위해 몸통 둘레에 다리를 우스꽝스럽게 접어놓을 수밖에 없는 딱정벌레도 있고, 뿔이 너무 커서 서랍 안에 눕혀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무기가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종도 많다. 이를테면 서아프리카 말벌의 얼굴에 돌출한 엄니나, 파리의 얼굴에 멋지게 돋은 널따란 뿔이 그랬다.
나는 극한의 무기를 연구하기로 하고 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기괴하고 가장 얄궂은 동물을 찾아 나섰다. 한편으로 나는 어디든 이국적인 곳에서 연구를 하고 싶었다. 내 경우에는 그게 열대지방일 수밖에 없어서 탐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내 연구 동물은 손쉽게 많은 개체를 발견할 수 있고, 야생에서 관찰할 수 있고, 잡아서 기를 수 있어야 했다. 운명적으로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 것이 곤충과 동물이었다.
어느덧 20년이 지난 지금도 열대지방에서 첫해를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딱정벌레의 무기 같은 곤충의 무기에 나는 여전히 압도된다. 나는 아프리카로, 호주로, 중남미 전역으로 녀석들의 이야기를 따라갔다. 그리고 사슴뿔 파리와 농게부터 코끼리와 엘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곤충과 동물들의 너무나 많은 극한의 무기를 연구한 생물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합할 기회를 얻기에 이르렀다. 이 책에서 말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가장 사치스러운 무기를 지닌 자연계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우른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 동물의 무기
더글러스 엠린 글·데이비드 터스 그림 | 북트리거 펴냄 | 408쪽 | 19,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