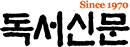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시인들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시민이라 여기면 얼마나 친근할까요. 신비스럽고 영웅 같은 존재였던 옛 시인들을 시민으로서 불러내 이들의 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국민시인’, ‘민족시인’ 같은 거창한 별칭을 떼고 시인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시도 불쑥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
뵈는 듯 마는 듯한 설움 속에
잡힌 목숨이 아직 남아서
오늘도 괴로움을 참았다
작은 작은 것의 생명과 같이
잡힌 몸이거든
이 서러움 이 아픔은 무엇이냐.
금단의 여인과 사랑하시던
옛날의 왕자와 같이
유리관 속에 춤추면 살 줄 믿고……
이 아련한 서러움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면
재미나게 살 수 있다기에
미덥지 않은 세상에 살아왔었다.
지금 이 뵈는 듯 마는 듯한 관 속에
생장(生葬)되는 이 답답함을 어찌하랴
미련한 나! 미련한 나!
-김명순, 「유리관 속에서」
날아가다
이 땅 남자들이 모두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아니 군대 갔다 온 남자들만 겪는 정신 외상입니다. 제대한 지 까마득한데 여전히 푸른 제복을 입은 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다하거나 가시 철망을 앞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꿈속에서도 분명 현실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헤어날 수 없어 허우적대다 비명 속에 깨어나곤 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꾼 날은 불길하다 못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땅 여자들도 흉몽 속을 헤맵니다. 그런데 백일몽이 아닙니다. 한낮 허무한 잠 끝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시인은 유폐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는’ 삶은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유리관’ 속에 가두어 놓으려 합니다. 거부하면 ‘금단의 여인’으로 낙인찍힙니다. 그림형제가 쓴 『라푼젤』 동화처럼 ‘금단의 여인’을 사랑하는 ‘옛날의 왕자’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깨닫는 순간 그는 축소되어 왜소해집니다. 생매장된 자기 처지를 확인할 뿐입니다. 결국 스스로 ‘미련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미련한 나’를 반복해 되뇌는 모습은 일종의 발작과 같습니다. 어쩌면 히스테리로 비칠 이 난폭성과 자기 징벌적 행위는 모든 것을 해소하는 대단원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명순은 나혜석과 더불어 우리 현대문학 첫새벽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창조>는 1919년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 종합 문예 잡지입니다. 이 잡지를 말할 때마다 김동인, 주요한, 전영택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김명순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존재했는데도 없는 듯이 치부되는 역사의 악몽은 기억 저편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시대 상황은 좌절과 상실감에 싸여 과거 영화로운 세상을 회상하며 탄식하는 나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김명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진출한 여성이 다시금 가정이라는 유폐된 공간으로 회귀하는 좌절의 시나리오를 통해 당시 시대 흐름을 거슬러 고착된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가고자 했습니다.
■작가 소개
이민호 시인
1994년 문화일보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참빗 하나』, 『피의 고현학』, 『완연한 미연』, 『그 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