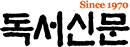고전 독서토론 플랫폼 ‘필로어스’는 매주 정기적으로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루에 고전 한 권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원데이 세미나는 고전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싶은 참가자들이 만나 고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다. 필로어스의 튜터(교사)는 참가자들이 해당 고전과 관련된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등의 역할을 하며, 덕분에 참가자들은 서로의 신상정보나 책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로 빠지지 않은 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지난달 개최된 원데이 세미나에서 선정된 고전은 『파놉티콘』. 15명의 참가자와 튜터가 모여 한 자리에 모여 고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파놉티콘』은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저서로,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의 이상적인 건축양식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런데, 벤담이 생각한 감옥은 어딘가 수상하다. 수감자가 출소했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옥이 범죄자를 돕기만 하면 뭐하냐고, 범죄자에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벤담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벤담이 구상한 감옥은 중앙에 높은 원형 감시탑이 있고, 그 주위에 수감자가 머무는 감옥이 둘러싸고 있는 도넛처럼 생긴 원형 건축물이다. 같은 원형건물에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감시자가 더 높은 곳에서 수감자를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감자는 감시자가 항상 자신을 지켜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감옥이 강제하는 규율을 스스로 따르게 된다. 수감자는 감시자가 보인다면 그들의 눈을 피해 딴짓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율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수감자가 알아서 감옥의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벤담이 구상한 ‘파놉티콘’ 건축양식이었다.
나아가 벤담은 이같은 건축 양식을 감옥 외에 학교나 공장 등 기관에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벤담이 구상한 건축양식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수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벤담의 감옥은 현대의 감옥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필로어스 토론은 구성원들이 이같은 파놉티콘에 대한 정보와 벤담의 생각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이 날의 주제는 “과연 파놉티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였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통제로 하여금 갱생의 기회를 받는 피감시자들인가.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생각을 내놓으며 대화에 참여했다. “파놉티콘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사회를 지배하고 특혜를 누리고자하는 소수 혹은 권력자를 위한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파놉티콘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내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등 자기계발적(?) 질문을 내놓기도 했다.
필로어스의 토론은 고전을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어렵고 학술적인 내용이 오고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필로어스는 고전을 읽은 소감과 저마다 ‘바보같은 질문’을 발표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고전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거나, 벤담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등의 강론은 없다.
고전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를 우려해 참여하기가 꺼려졌다면, 필로어스 원데이 세미나에 참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