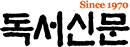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 어떤 책은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 속 명문장’ 코너는 그러한 문장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

운명이 어머니와 딸 사이를 찢어놓았다. 그런데 이 단절은 어머니라는 존재의 운명이기도 하다. 이(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신화처럼 잔인하게 찢기느냐, 덜 파국적으로 갈라서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출산부터 그러하다. 한 존재는 탯줄을 잘라야만 탄생한다. 막 세상에 태어나려는 아이도, 이를 견뎌내는 어머니도 혹독한 산통을 치른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다시 심리적 탯줄을 자른다. 혼인이야말로 또 다른 탯줄 자르기다. 아이가 자기 가정을 꾸리면, 어머니는 빈 둥지에 남는다. 한 존재의 성장이란 되풀이되는 독립의 역사이고, 이때의 분리는 어머니와 가정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다. <32쪽>
페르세포네에게 하데스와의 만남은 데메테르 여신이 생각하듯 한시 바삐 잊고 싶은 ‘악몽’만이 아닐 수 있다. 두렵고 놀랐지만, 더 큰 운명의 수레바퀴가 자기 삶을 굴리고 있다는 직관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하데스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페르세포네는 다른 인물이다. 엄마 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모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것이다. 엄마의 어여쁜 딸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 페르세포네의 호기심은 더 커다란 미지를 향해 확장된다. <47쪽>
현대 문명은 야생의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을 발전이라 믿으며 구축되었다. 그러니 이 편치 않은 마음은 마땅한 결과일 법한데, 인류가 언제나 이런 태도를 고수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자. 한때 가장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던 그리스다. 야생에 대한 그리스인의 이데올로기는 현대인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들은 이 자리를 인식했고 존중했고 신성시했다. 다면적인 인간 정신의 르네상스에 야생이 주요한 한 영역이었고, 이 자리가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홈그라운드다. <150쪽>
야성은 여성성의 주요한 측면이다. 주류 문화도, 이데올로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일상의 조련도 결코 훼손할 수 없는 강하고 두렵고 아름다운 생명 본연의 힘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으로 시작되는 말들은 ‘길들임’과 ‘순화’, 그래서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재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죽어간 야성은 내면에서 어떤 신음 소리를 내고 있을까? 올가미에 걸리고 우리에 갇힌 야생의 그림자는 어떠할까? <173~174쪽>
[정리=김혜경 기자]
『마음 오디세이아 1』
고혜경 지음 | 나무연필 펴냄 | 268쪽 | 1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