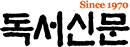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여성은 벌거벗어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가?” 1989년 여성주의 미술 단체 ‘게릴라 걸스’가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바로 앞에 설치한 포스터에 담긴 문구다. 이 문구의 아래쪽에는 “미술관의 현대미술 분야에서 전시되는 작품 중 여성 미술가의 작품은 5퍼센트 미만이지만, 미술관에서 소장하는 누드화의 85퍼센트가 여성을 그린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게릴라 걸스는 이 프로젝트로 뉴욕시 예술 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뉴욕시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금을 철회하면서 자비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다.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문제의식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최근 출간된 『불편한 시선』은 게릴라 걸스가 최초로 제기했던 질문인 ‘왜 여성 누드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를 비롯해 여성의 시선으로 미술사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불편함에 천착하는 책이다.

고전 미술 작품, 특히 미술관에 소장되는 작품 중에는 유독 여성의 누드가 많다.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표현양식인 누드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미술사가 케네스 클라크는 ‘누드’와 ‘벌거벗음’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 우리 대부분이 벌거벗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 누드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는 무방비의 웅크린 몸이 아니라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몸, 즉 재구성된 신체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클라크의 주장이 남성 누드가 아닌 여성 누드에도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누드 조각상의 대표 격인 다비드와 비너스의 예를 든다. 구약에 등장하는 영웅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1501~1504)은 온몸의 근육이 돌을 던지는 행위에 집중돼 있어 강인하고 당당해 보인다. “그는 관객이 서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의 과업에서 몰두하는 중이다”.

반면 안토니오 카노바가 조각한 비너스상(1822~1823)은 옷으로 몸을 급하게 가리고 주위를 살피며 도망치려는 듯한 모습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비너스가 물에서 탄생했다고 표현돼 있을 뿐, 물에서 나와 이처럼 당황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비너스가 겁내는 대상은 신화 속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현실의 관객, 그중에서도 당대의 지배적인 관객이었던 남성이다”. 저자는 “비너스상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포르노”라고 주장한다. 고대에 만들어진 프락시텔레스의 비너스상(기원전 4세기)이 있던 신전에는 밤이 지나면 정액 냄새가 진동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여성의 누드는 대상이 여신일지라도 현실적인 섹슈얼리티를 자극하는 ‘무방비의 웅크린 몸’으로 표현되곤 했다. 알렉상드르 카바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1863) 속 비너스도 마찬가지다. 카바넬의 비너스는 늘씬하고 풍만한 몸매를 최대한 굴곡지게 드러내는 포즈로 누운 채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눈을 가리고 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국가공모전인 살롱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같은 해 그려진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1863)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다. 한 여성이 프락시텔레스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는 이 그림은 살롱전에서 공분을 샀다. 관객들은 그림을 보고 분노해 우산이나 지팡이로 작품을 훼손하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은 이 그림이 그토록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인 이유는 “매춘부 같은 여성이 눈을 똑바로 뜨고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누드화는 남성 관객의 관음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고, 정면을 바라보더라도 유혹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했다. 벌거벗었지만 심드렁한 표정으로 관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올랭피아의 ‘시선’은 언제나 시선이라는 권력의 주인이었던 남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과거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미술 작품에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을 느껴도 그 명성 때문에 스스로 지레 반성부터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미술계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작품이 신화로 남으려면 특정한 ‘인정 시스템’의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누군가의 취향, 누군가의 이론, 누군가의 지원이라는 성근 그물망 안에서 살아남는 과정은 그 작품에 대한 한 시대의 총체적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래 묵혀 온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