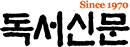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설립된 이 기관이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바꾼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수십년 전 외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히 눈부신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어느덧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고,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국제 사회 내 한국의 지위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나’라는 반성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한국인들의 겸손한 성격 때문일까. 이정동 교수의 책 『최초의 질문』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독창적인 사례를 제시하거나 도전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탓이다. 즉, 한국은 선진국이 밟아왔던 길을 뛰어난 수준으로 따라왔지만, 다른 국가들이 그전까지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나 기술을 갖추는 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한국은 그동안 문제를 푸는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로서 익숙해진 관행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며 “추격의 정점을 지나 진정한 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은 축적의 지향으로서 도전적인 최초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최초의 질문은 ‘기존 분야에서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규범을 제시하려는 뜻이 담긴 질문, 즉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로드맵을 벗어나 다른 목표를 제시하거나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등을 최초의 질문의 예라고 보면 된다.

최초의 질문을 던진 사람의 예로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제시된다. 통상적으로 로켓은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면서 연료를 소진한 추진체(1단 로켓)를 분리한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시장에 도전하기 전, 바다에 떨어진 1단 로켓은 따로 회수해서 버리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상식을 상식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는 “1단 로켓을 다시 쓰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1단 로켓을 재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주로 날아오르는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그는 이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회사를 세우고 재사용 로켓 개발에 착수했다.
마침내 일론 머스크는 네 차례의 실험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1단 로켓은 해상 바지선에 성공적으로 착륙해 다른 발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위성도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그의 최초의 질문 하나로 스페이스 X는 민간 우주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로 우뚝 올라섰던 것이다.
반면 최초의 질문이 부재하면, 집단은 몰락하기 마련이다. 10여년 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지키다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몰락한 노키아가 그랬다. 2004년 사원이던 ‘아리 하카라이넨’이라는 인물이 경영진 앞에서 ‘인터넷 접속, 컬러 터치스크린, 고해상도 카메라, 심지어 앱스토어까지 담긴 스마트폰 시제품의 기능을 선보였으나, 내부에서 제지됐다.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저자는 “끊임없이 업계의 룰을 갈아 치우는 세계적 기술 선도 기업에는 도전적인 최초의 질문이 넘쳐난다”며 “한때 혁신의 제국이었어도 최초의 질문이 없으면 소리 없이 스러진다. 예외가 없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최초의 질문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의지와 야망을 담고 있다”며 “이 질문으로부터 희미한 첫 번째 대답을 구하고, 개선하고, 좋은 쓰임새를 찾는 스케일업(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뜻)을 이어 가다 보면 마침내 눈사태처럼 지금까지 있던 지형을 완전히 뒤엎고 바꾸는 혁신이 탄생한다”고 조언한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