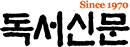어느 때보다 개인의 취향이 중요해진 시대다. 취향을 예찬하는 책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세 출판사가 번갈아 펴내는 ‘아무튼’ 시리즈와 민음사출판그룹에 속한 세미콜론 출판사의 ‘띵’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다. ‘아무튼’ 시리즈는 ‘지극히 사적인 취향’에 대한 에세이를, ‘띵’ 시리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음식 취향 에세이를 펴낸다. ‘아무튼’ 시리즈가 첫선을 보인 지난 2017년에는 돈이 되지 않을 기획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몇 년 사이 ‘지극히 사적인 취향’은 출판계의 대세가 됐다.
취향을 소재로 에세이뿐만 아니라 소설도 나온다. 최근 출간된 구한나리 작가의 소설집 『올리브색이 없으면 민트색도 괜찮아』는 문구류 취향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 가는 10대 청소년의 모습을 그렸다. 표제작에 등장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각자 확고한 펜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펜 취향은 친구와 싸우는 이유가 되기도, 새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지혜 사적인서점 대표는 이 책의 추천사에서, “펜을 눌러 쓰는지, 심이 굵은 게 좋은지 가는 게 좋은지 따져 묻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자신을 알아 가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렇듯 취향은 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에 따르면, 우리의 취향과 기호는 개인적 선택이 아닌 우리를 둘러싼 사회·경제·문화 환경의 산물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만 취향과 기호의 자유를 가지며,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자본의 논리에 의해 선별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취향이 반짝 유행하다 사라지는 현상에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책 『소비 수업』의 한 부분이다.
“한때 와인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와인을 다룬 만화 『신의 물방울』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고, 와인의 종류와 맛, 빈티지에 대해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 사교적이라 생각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수집하고 와인 바를 찾아다니곤 했다. 소믈리에를 초빙하여 주기적으로 와인 공부를 하는 모임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자리를 사케가 차지하는가 싶더니 또 얼마 후엔 수제 하우스 맥주가 유행이다. 하우스 맥주의 제조법이나 맛 품평, 추천 맥주에 대한 글들을 SNS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재교육에 대한 강박, 현대 소비사회에서 유행이란 그런 것이다.”

부르디외는 또한, 취향의 차이가 계급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휴일에 영화관을 찾는 사람과 미술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소비 수업』 中) 사이에는 개인적 특성을 넘어서는, 배경이나 학벌 같은 경제적·계급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향에는 환경적 여건이 크게 관여한다. 가난한 청년 주인공이 위스키와 담배라는 취향을 지키기 위해 생활의 다른 모든 요소를 차례로 포기하다 종국에는 노숙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소공녀>는 형편에 맞지 않는 취향을 갖는 일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소설에서 청소년을 대표하는 취향이 ‘문구류’였던 것도 그들의 주머니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취향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은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인 취향’이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지, 넘쳐나는 취향 예찬이 계급적 차이를 단순히 개인적 차이로 여기게 하며 점점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