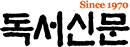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내일은 비가 올지 안 올지, 코로나19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인간은 방황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방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인간은 ‘예측’이라는 것을 한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예측은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마틴 반 크레벨드 교수는 이 예측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행위라고 설명한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의지와 그 능력은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인간 삶에서 결코 과장할 수 없는 크나큰 역할을 한다”며 “그 이름이 예측이든 예지력이든 선견지명이든 예보든 예언이든 간에, 우리가 아는 인간의 삶은 이것 없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책 『예측의 역사』에서 인간이 미래를 보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예측에 사용한 기법들을 추적한다. 점성술, 해몽, 트렌드 분석, 통계 모델링 등의 기법들은 저마다 나름의 추론 방법을 사용한다. 애니미즘(animism) 역시 마찬가지다. 고대 사람들은 날씨와 난파 사고, 지진처럼 인간 삶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을 예측하는 능력이 여러 동물에게 있다고 믿었다.
크레벨드 교수는 “다람쥐와 까치가 먹이를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찾아 먹음으로써 예지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어류학자들이 실시한 몇몇 실험은 물고기 역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어떤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해안가의 못이 곧 마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옆의 못으로 옮기고, 지진의 전조 현상 중 하나인 ‘개미떼의 이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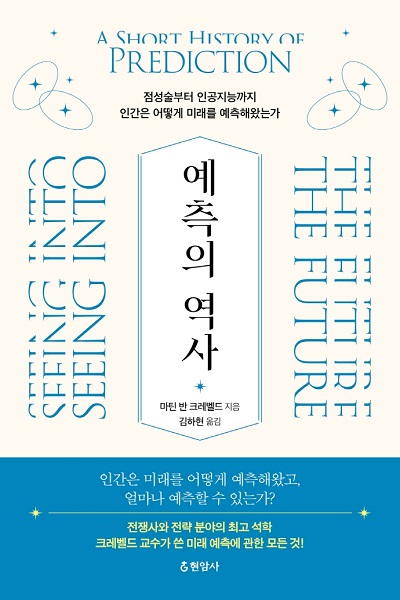
이런 예측은 근대로 오면서 합리적으로 변해 갔다. 바로 ‘패턴’과 ‘사이클’이다. 반복하는 과거를 통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경기의 순환’이다. 크레벨드 교수는 “경제가 독자적인 모멘텀을 지니고 있어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주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은 19세기 전반에 처음 등장했다”며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순환 모델은 여전히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예측 행위는 여러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게 됐다. 현대의 예측 도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통계 모델과 그 모델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다. 패턴과 사이클이 정교하게 진화한 방법인 셈이다. 21세기 초반인 현재, 숫자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한 미래 예측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게 크레벨드 교수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요소와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수학적 공식을 적용하여 모종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측의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역시나 예측은 100%가 될 수 없다. 특히 물리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사회적 요소가 클수록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크레벨드 교수는 “미래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확실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자마자, 또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자마자 현재는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로, 때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고 설명한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