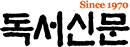아침마다 부엌에 선다. 어릴 적 엄마의 부엌에서 건너오던 그 살풋한 소리를 떠올리며 나, 그 소리를 참 좋아하던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젖어 든다. 그때의 엄마처럼 나 역시 한결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밤새 잘 마른 식기들을 정리하고 패브릭을 개킨다. 우리 아가 놀라지 말라고, 또 한편으론 엄마 여기 있다는 표시인양 그런다.
주방엔 볕이 잘 드는 창과 맵시 좋은 커피 머신이 있다. 꽃과 책과 작은 스피커가 있다. 나의 상냥한 부엌 동무들이다. 이들이 있기에 설거지하며 음악을 듣고, 국 끓는 냄비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책을 펼친다. 식탁에 앉아 글을 쓰는 엄마 옆에서 아이는 참방참방 ‘실험’이라 이름 붙은 놀이를 한다. 아무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여기도 엄연한 ‘방’이니 말이다.
요즘은 이 방에 못 해도 하루 댓 번은 서는 것 같다. 나야 한 끼쯤 건너뛰어도 그만이지만 한여름 잎새처럼 자라나는 내 곁의 소년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 해를 더할수록 먹는 일에 점점 시큰둥해지는 나와 달리 아이는 그대로 아이다워서, 끼니때 오기가 무섭게 눈을 빛내며 물어온다. “이제 뭐 먹어요?” 아. 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연한 부름인가.

해서, 지난 몇 달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그러니까 그만큼의 부대낌과 노고가 추억으로 치환된 곳이 바로 주방이다. 내 손을 거친 자잘한 것들이 아이 볼 속으로 야곰야곰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좋아서, 수시로 팔을 걷어붙인다. 씻고, 굽고, 끓이고, 치운다. 자연스레 아이 있는 집 특유의 더운 김이 종일 부엌을 맴도는 요즘. 아이가 자라는 소란과 훈기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부엌세간에도 부쩍 더 마음을 써본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의 섬 몇 개를 동동 띄워놓고 눈짐작 손짐작으로 차려낸 걸 싹 비운 아이가 엄마, 더 주세요. 엄마 밥 최고! 하고 통통한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일 때면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는데 만점 맞은 기분이랄까. 별거 아닌데 좋아해 주니 그런 으쓱한 기분마저 든다. 언제쯤 내 밑천이 드러날진 모르지만, 사랑담은 엄마 밥이니까 좋아해 줄 거라고 오늘도 호기롭게 믿어나 본다.

매일 무언가 찰찰 헹궈지고 펄펄 끓는 부엌에서 아이는 쌀이 어떻게 밥이 되고 그릇이 제 자리로 들어가는지 지켜본다. 일러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만 밥이 나오고 부엌이 정돈된다는 것쯤은 이제 아이도 잘 알고 있다. 이 생선은 어느 바다에서 잘 잡히는지, 이 감자와 저 당근에 묻은 흙의 빛깔은 왜 다른 건지. 부엌에는 이야깃거리도 참 많았다.
무엇보다도 아이 밥에는 마음이 담긴다. 아무렇지 않게 밥을 푸고 나물을 무칠 때도 엄마라서 갖는 수굿한 마음이 깃든다. 소망보다는 감사로, 솜씨보다는 둥근 정으로.
어디서나 흔히 사 먹는 음식과는 비교 불가. 새겨지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여 엄마 밥상은 재료가 대단치 않아도, 별난 기술이나 화려한 양념이 없어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동서고금 엄마 밥은 엄마의 마음을 거쳐 아이 입으로 들어가기에 귀하다. 작은 접시 몇 개 차리고 둘러앉은 소박한 식탁을 내가 정말로 아끼는 이유.

아이는 오늘도 마음과 이야기가 담긴 국과 반찬을 먹는다. 뜨거운 국을 호호 불어먹고 콩나물을 아작아작 씹어 삼킬 것이다.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 그 말을 처음 만든 사람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겠지. 단출한 부엌에서 아이는 즐거운 얼굴로 ‘나도 같이해요!’ 말해온다. 녀석. 그 목소리 한번 봄 같네. 찬거리를 꺼내며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하아. 이렇게 종일 부엌을 쓰다듬다가도 금세 떠오르는 건 ‘귀찮은데 주먹밥이나 해 먹을까?’ 만들고 치우는 데 너무 애먹지 않는 간단한 요리가 나는 좋다. 이래저래 프로 살림꾼은 못 되지 싶다. 아마 ‘집콕 육아 시절이 쏘아 올린 근근한 살림러’ 쯤 되려나 한다.

■ 작가소개
- 스미레(이연진)
『내향 육아』 저자. 자연 육아, 책 육아하는 엄마이자 에세이스트.
아이의 육아법과 간결한 살림살이, 마음을 담아 밥을 짓고 글을 짓는 엄마 에세이로 SNS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