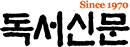패션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류 생산에 막대한 환경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일례로 간단한 옷차림인 면 티셔츠와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하는 데에는 약 1만 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이 물은 티셔츠와 청바지의 원료가 되는 면화 경작에 필요하고, 사용된 물은 화학물질을 잔뜩 머금은 산업 폐수가 된다. 이에 더해 폐수를 처리하는 데 탄소도 많이 배출된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가 의류‧패션 산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린 패션 업계가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자연스레 ‘지속가능성(Sustainable)’과 ‘재생가능성(Renewable)’이 패션 업계의 화두로 자리잡으면서 의류 수선 서비스와 렌털 서비스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럭셔리 백화점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셀프리지는 지난해 ‘프로젝트 어스’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5년간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옷 수선, 렌털, 재사용 서비스를 강조한다. 한편, 젊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중고 의류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크게 늘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패션 업계의 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과는 달리 의류 대여 서비스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 ‘환경연구회보’는 의류 처리 5가지 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그 중 렌털이 환경에 가장 유해하다고 발표했다. 의류를 공유하는 것 자체는 친환경적이나, 옷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탁(드라이클리닝), 포장(플라스틱 백), 운송(연료 소비) 등 의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피해가 의류를 대여했을 때 얻는 환경적 이익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다.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은 『라이프 트렌드 2022』에서 “만약 패션 렌털이 자원 순환과 친환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린 워싱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이 큰 산업”이라며 “최선은 옷 한 벌을 사서 오랫동안 입는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 입기 위해서 좀 더 비싸더라도 처음부터 내구성과 품질이 좋은 소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